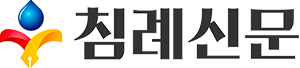개신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종교계 성범죄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간 종교계는 성범죄 대응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자율에 맡겨왔다. 그러나 권한 없는 자율은 공허한 구호였다. 피해자 보호도, 공동체 신뢰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숱한 성추문 사건이 반복됐고, 목회자는 충분한 회개와 회복 절차 없이 강단에 돌아왔다. 피해자는 2차 상처를, 교회는 신뢰의 붕괴를 감당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태도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는 거리 집회까지 나서며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작 교회 내부의 성폭력 문제 앞에서는 유독 조용하고 미온적이었다. 동성애든 간음이든 성경에서 금하는 죄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한국 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성범죄에 모호한 자율과 내부 처리를 내세워 제대로된 치리를 회피해 왔다. 간혹 스스로를 다윗에 빗대 면죄부를 주거나,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본문을 왜곡해 가해자를 감싸려는 모습까지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이런 이중적 태도야말로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목회자의 복귀 전 정신적 치료와 교육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단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일정 기간의 근신은 기본 전제다. 회개 없는 복귀는 피해자와 교회를 또다시 무너뜨릴 뿐이다. 종교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신뢰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종교인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 교단은 지난 111차 총회에서 성폭력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과거 그루밍 성폭력 사건 때는 가해 목사를 제명하기도 했다. 교단 내부의 성찰과 제도 마련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공론화되지 않은 사건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성범죄 문제가 교단 내부에 잠재돼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외부를 향한 목소리보다 먼저 내부 성찰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그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범영수 부장